210304
최진영 《이제야 언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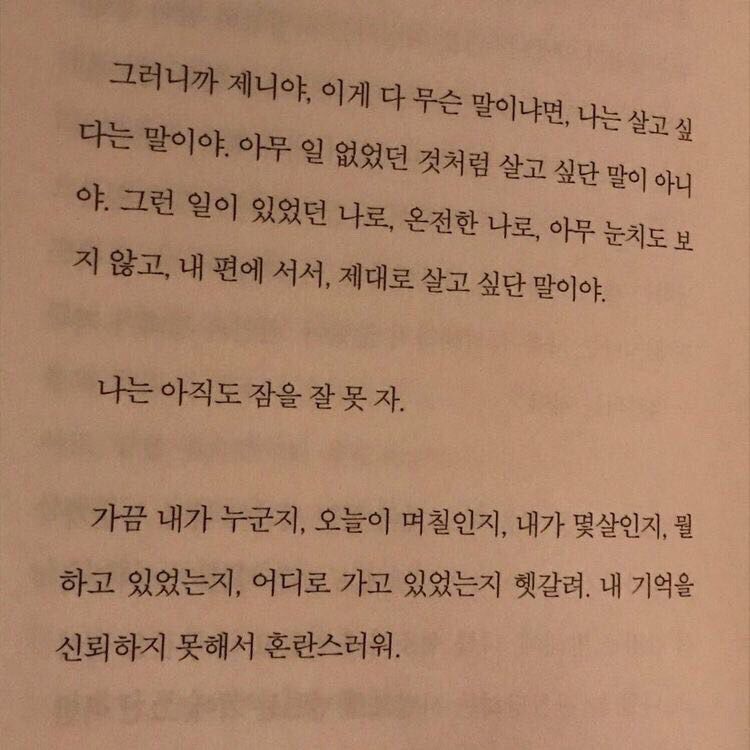
유명한 이 사진의 출처이다.
나는 7월 14일도 살았고, 15일도 살았고, 16일도 살았다. 그날들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는가.
(11p)
뭐라도 써야 한다고 제야는 생각했다.
오늘 겨우 한 단어를 쓰게 되더라도 내일 다른 단어를 얹고, 또 쌓아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왜냐면, 다들 지우려고 하니까. 제야도 지우고 싶었다. 지우려는 시도는 그날의 감각을 더욱 세게 끌어왔다.
(12p)
겨울에는 신기한 눈이 내리고, 눈을 맞으면 더 우아해지고, 쨍한 겨울 하늘도 좋다. 입김도, 담요도, 귤도 좋다. 밤이 깊어질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큰개자리와 오리온자리를 보면서 아까보다 지구가 이만큼 돌았구나 확인하는 시간도 좋다.
(16p)
모르겠다. 그냥 지금이 좋다. 하루하루를 꼭꼭 눌러서 살 수 있는 만큼 다 살아내고 싶다.
(17p)
우리에겐 각자의 그늘이 있지. 나는 그 그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늘이 그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도 같다.
(72p)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잘못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이었다면, 원래 이런 일을 겪을 인생이란 대체 뭐란 말인가.
(108p)
승호가 깁스를 풀고 목발 없이 걷게 되면, 어른이 되고 서른이 되면, 사람들은 승호의 교통사고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도 그럴 수 있을까? 내게 달라붙은 더러운 소문과 억측을 지우고 나를 대할 수 있을까?
(132p)
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서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어.
(167p)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곳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지?
여자애.
여자도 아닌 여자애.
계집애가 겁도 없이.
(202p)
그러니까 제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살고 싶다는 말이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단 말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던 나로, 온전한 나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편에 서서, 제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나는 아직도 잠을 잘 못 자.
(224p)
나는 어린 여자애여서 무시당했다가 젊은 여자여서 의심받고 늙은 여자라서 무시당하게 될 거야.
(226p)
성폭력 생존자 '이제야'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이제야 언니에게'라는 제목에서의 '이제야'가 곧 고유명사로 변하고, 결말 부분에서 '이제야'라는 고유명사가 '제야'라는 일반명사로 변하고, 책을 다 읽은 후 '제야'라는 일반명사에서 다시 '이제야'라는 일반명사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당숙'이 가해자라는 걸 책 소개에서 이미 스포일러(?)당해서, 아는 채로 읽었다. 그런데도 작중 묘사되는 당숙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품은 듯한 묘사가 하나 없이 오히려 시종일관 무척 다정하고 어른스러워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면모는 가해자라고 하여 무조건 100%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선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약자를 향해 폭력을 가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 같았다. 실제로 제야가 작품 내에서 당숙은 괴물도 악마도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한다. 단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앞에 자신이 있었던 거라고. 그를 의심하지 않으며,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가까이서 통제할 수 있는, 미성년자 친척 여자인 자신이.
본문에서 제야를 향하는 2차 가해 발언이 너무 많았던 탓에 독자인 나까지 숨이 막혔다. 그런 말들이 아주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아직도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만연한지 확 실감이 되더라. 제야가 머물게 된 강릉 이모와의 시공간을, 그리고 이모를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었다. 늘 위태로워 보였던 제야가 이모와 있을 때만은 편안해 보여서. 점점 심적 안정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여전히 가방에 과도를 챙겨다니는 제야이지만 이모가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친근하게,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형태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다가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이런 인식조차 어쩌면 약자를 향한 나의 상대적 권력을 드러내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위태로운 삶, 방황하는 삶, '다행'이 아닌 삶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내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감히 평가하고 동정해도 되는가?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내 멋대로 인물의 이전 자취를 무의미한 시간으로 돌려버려도 괜찮은 걸까? 그것은 폭력이 아닌가?
어쩌면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틀에 인물을 가두고, 그의 미래 행동을 은연중에 예측하고 있던 것 같기도 했다. 성폭력 생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니까 결말은... 아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함축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 점을 깨닫고 좀 부끄러웠다. 책을 다 읽을 때까지도 주인공이 어릴 적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 같아서. 물론 이 책 자체가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제야의 삶을 가감없이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제야의 인간관계나 성격에서의 변화보다도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만을 주목하며 읽고 있던 게 사실이었다. 혹시 나도 피해자다움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제야의 입을 다물게 하려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래서 제야가 과거의 일을 깨끗하게 지워내고 싶지 않다고 한(그 경우 당숙의 죄까지 같이 사라지기 때문) 부분이라거나, 제니와 승호처럼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제야에게 도망치라고, 또는 도망치지 말라고, 피해자답게 굴라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라고, 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야는 그냥 제야고, 제야의 삶도 그냥 제야의 삶. 제야는 미로의 출구를 찾아가기보다는 미로를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길을 택했고 그것은 오랜 시간과 생각을 거쳐 형성된 결정. 그 선택을 끝으로 책을 덮으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➂'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학/소설] 《내 여자친구와 여자 친구들》 | 조우리 (0) | 2021.03.13 |
|---|---|
| [문학/소설] 《적어도 두 번》 | 김멜라 (0) | 2021.03.09 |
| [문학/소설] 《연년세세》 | 황정은 (0) | 2020.12.31 |
| [문학/시] 《마음의 일》 | 재수X오은 (0) | 2020.12.27 |
| [문학/소설] 《우리는 같은 곳에서》 | 박선우 (0) | 2020.12.08 |



![[문학/소설] 《연년세세》 | 황정은](http://img1.daumcdn.net/thumb/C300x300/?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Xopkn%2FbtqRTSKapOd%2FCoqN0OvRp9U7gvtFC07O60%2Fimg.jpg)
![[문학/시] 《마음의 일》 | 재수X오은](http://img1.daumcdn.net/thumb/C300x300/?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s3SX3%2FbtqRCV8helH%2FuOK6smRH1fVRisa1oR8oU0%2Fimg.jpg)